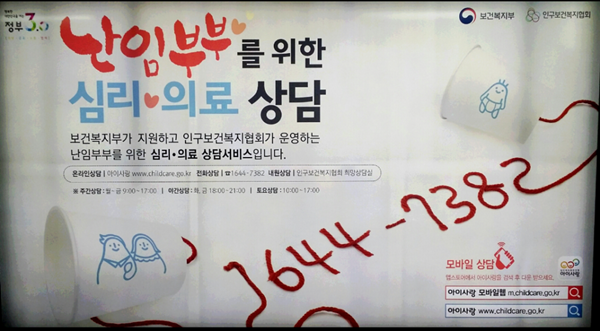
[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국내 난임진단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난임진단자는 지난 2007년 17만 8천명을 기록하다 꾸준히 그 수가 늘어 2016년에는 22만 1천명까지 증가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 임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일컫는 난임은 남성·여성 요인에 의해 모두 발생할 수 있다.
난임 환자들은 주로 난임 시술과정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곤 한다. 지난 2016년 ‘난임지원대책 모색’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난임시술 초기에 성공하지 못해 시술이 장기화되는 경우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주변 시선이 의식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06년부터 정부는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임으로 인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넓혀 지난달 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조항을 신설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되면서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난임 치료 휴가를 받으려면 근로자는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허나 일각에서는 3일간의 휴가일수로 난임치료를 시행하기에는 터무니없이 기간이 짧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난임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방안 마련’을 촉구한 한 시민은 지난 6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난임휴가 3일이 그다지 도움되지 않는다”며 “좀 더 현실을 반영한 저출산 대책을 고민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시험관 한 번 할때마다 병원에 수시로 가야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난임휴가 3일 그다지 도움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덧붙여 청원자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난임휴직과 임신 중 육아휴직 정책을 전 기업에 적용될 수 있게 해달라”며 “휴직 과정이 무급이라 할 지라도 제도적인 보호장치 안에서 휴직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진작에 휴직하고 시험관에 올인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는 대개 1년에 여섯 차례 정도 가능하다. 단 한 번의 시술로 임신에 성공하게 될 확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많이 할애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진단된 난임의 원인에 따라 치료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배란 유도 등의 치료 시에는 의료진이 정한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3일간의 난임휴가만으로는 직장인 여성들이 난임치료에 온전히 사활을 걸기에 어렵다.
공무원의 경우 최대 2년간 난임휴직이 가능하다. 허나 민간기업까지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3일간의 난임휴가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면서 ‘난임휴직’ 제도를 공무원 외에도 민간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뉴코]